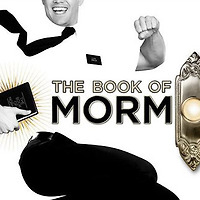내 생애 첫 관람한 오페라는 아마 푸치니의 [나비 부인]이었던 것 같다. 그 때 나는 무척 어렸고,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을 따라갔던 공연장에선 공포의 환영을 달고 돌아왔다. 가부키 화장을 한 하얗고 커다란 일본 여자가 자꾸만 꿈에 나타났다. 그 땐 그게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른다. [나비 부인]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슬픈 이야기였는데 말이지.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비제의 [카르멘]도 봤었는데, 이건 그럭저럭 재밌었다. 붉은 의상의 카르멘이 추던 플라멩코와 노란빛의 투우 경기장이 어렴풋이 기억에 남는다.
뮤지컬이란 장르에 꾸준히 재산 탕진해 온 반면, 오페라는 너무 비싸기도 하고 딱히 취향도 아니라 내가 직접 선택해서 관람한 적은 없었는데, 늘 시도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 다소 진입 장벽이 있는 이 장르를 내가 즐길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오페라는 음악적으로 풍부하니까. 비엔나에서 근무를 하셨던 직장 선배가 주말 특근을 하면서 오페라를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듣는 모습을 보면서 막연한 동경심도 들었던 것 같다.
이후 오페라 관람을 위한 자발적 시도는 고작 한 손에 꼽을 정도 뿐이지만, 아, 정말이지 나는 모든 판에서 완패하고 말았다. 돌이켜보면 그저 편안하게만 감상할 수 없는 오페라에 대한 사전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여전히 오페라라는 장르에 대한 매력은 온전히 느끼지 못하겠지만 나아질지도 모르리라는 희망을 품고 지난 오페라 관람 수난기를 풀어본다. 노파심에서 강조하면 이건 '수난기'지 '감상문'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 읽고 나서 작품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얻을 수 없었다고 노하지 말기.
아마도 2009년, Yvonne, princesse de Bourgogne, Paris Opéra (Garnier)

사실 공연 관람의 목적보다는 오페라 가르니에의 내부 관람을 위해 가장 저렴한 좌석을 구매했었다. 내부 관람 시간이 끝나서였는지 내부 관람과 공연 관람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너무 옛날이라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 가장 저렴한 좌석은 오페라 가르니에 천정에 붙어 있는 구석자리로 이런 자리를 어떻게 돈 받고 팔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시야 장애가 큰 곳이었다.
무대도 안 보여, 말도 못 알아들어, 시차 적응도 안 됐어, 음악은 뚱띵뚱땅 포스트 모던해. 자리 지키고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인터미션 때 아래 박스석으로 들어가서 샤갈의 천장화를 봤었다. 흔쾌히 들어와보라고 맞아주시던 노년의 아저씨는 본인의 나라인 오스트리아 오페라 하우스가 이 곳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다고 자랑하셨고, 그 이후로 오스트리아 오페라 하우스는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다음 번 방문 때 그 계획을 성취하긴 했지만, 비엔나의 오페라 하우스보다는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가 훨씬 더 아름답던걸?
2013/6/19 18:00, Die Walküre, Paris Opéra (Bastille)
![]()
파리에서 가장 아쉬운 건, (물론 돈은 많이 들지만) 원없이 볼 수 있었을 발레와 오페라에 내가 정을 붙이지 않아서 좋은 공연을 많이 놓쳤다는 거다. 연극도 많이 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살면서 이를 누리지 못했다니... 파리를 떠나기 전,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는 계획으로 오페라 바스티유에서 관람 가능한 오페라를 찾았고, 유일한 옵션이 바로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시리즈 중 발키리였다. 오페라 가르니에에선 발레를 보고 싶었지만 관람 가능한 공연이 없었다. 여름철이 되면서 극단도 모두 바캉스 모드에 진입했기 때문. 아쉬운 대로 몇 년 전 출장길에 오페라 가르니에에서 오페라를 관람한 적이 있었으니.
꽤 비싼 값의 좌석이었지만 제일 꼭대기층이었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꼭대기층을 벗어날 수는 없는 신세; 하지만 새로 지어진 오페라 바스티유는 어디에 앉아도 시야 장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가장 저렴한 좌석이긴 했지만 시야 장애 없이 관람할 수 있었다. 다만, 바그너는 편하게 소화할 수 있는 오페라가 아니었고, 독립적으로 개별 관람이 가능하다고는 해도 내가 관람한 작품이 4부작 중 중간 에피소드라서 감을 잡기가 더 어려웠다. 독일어로 불리는 노래를 멀고도 먼 좌석에서 콩알만한 프랑스어 자막으로 따라잡아야 하는 것도 무리였지만, 훗날의 경험에 의하면 언어의 문제보다는 오페라라는 장르가 아직은 내겐 낯설고 불편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탓이 제일 컸다. 그리하여 파리 떠나기 전 오페라 바스티유 클리어! 정도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에 만족해야만 했고, 엄청난 공연 시간에 인터미션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인터미션마다 간식과 음료를 제공해준 게 인상적이었다. 음식 값이 포함되어서 표가 그만큼 더 비쌌던 거였지만 나름 재밌는 경험.
2013/7/12 21:45, Der Fliegende Holländer, Chorégies d'Orange
가족 방문을 앞두고 출장 온 친구에게 [프로방스 라벤더 로드]라는 책을 부탁해서 읽다가, 고대 로마 유적인 반원극장이 있는 Orange에서 매년 여름 오페라 축제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대 유적이라면 깜빡 죽는 나는 프로방스 여행 동선에 Orange를 포함시키고 바로 표를 예매했다. 고대 극장에서 실제로 공연을 볼 수 있다는 흔치 않은 기회에 매혹된 반면, 오페라라는 장르에 대한 여전한 의구심을 떨칠 수는 없었다. 이 날 동선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시간이 촉박해 가고 싶었던 식당에도 못 가고, 간단히 식사하고 겨우 시간 맞춰 입장했더니 전화 상담까지 해서 그나마 고르고 골라 예매했던 좌석은 이미 다른 관객들 차지였다. 프랑스는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도 일정 시간 안에 관객이 도착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좋은 좌석에 다른 관객을 앉혀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곤 하는데, 물론 좌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고, 좌석 업그레이드를 경험하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행운이지만, 엄연히 공연 시작 전인데 남의 좌석을 채워버리는 건 무슨 경우냔 말이냐.
그래서 남은 좌석 겨우 찾아 앉아서는 한동안 툴툴댔었다. 이 날 Orange에서의 일정이 전반적으로 예정과 달라지기도 했었고. 게다가 하필 이 날의 오페라도 바그너였다. 이번엔 스토리를 숙지하고 음악도 미리 좀 들어보고 갔는데 스토리가 단순해서 지난 번 바그너보다는 훨씬 이해하기 쉬웠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서곡은 정말이지 멋졌지만, 여전히 오페라라는 장르는 내게 흥미를 주지는 못했다. 무대에 오직 두 사람만이 서서 제 자리에 꿈쩍도 않고 서서 15분 이상을 노래하는 장면을 왜 '듣는' 행위 이상인 '보는' 행위로 감상해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졸다가 깼다가 나중엔 겨우 집중할 수는 있었는데, 감동은 없었다. 그래도 여름밤 Orange 고대 반원극장에서의 공연 관람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묘미가 있었고, 공연 후 아이스크림 하나씩 들고 이미 어둡고 텅 비어버린 거리를 걸었던 기억도 행복하게 남아있다.
2013/11/7 19:30, Magic Flute by English National Opera, London Coliseum

오페라에 대한 무감흥에 대해 토로하자 내가 너무 어려운 작품만 본 게 아니었냐는 친구의 지적에 ENO가 영어로 노래하는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이 쯤 되면 나도 포기를 모르는 노력파 아닌가?; 지난 날의 참패에도 불구, 쉽게 폄하하거나 단정짓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것저것 노력은 해보았단 말이다. 좌석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 공연 관람 역사상 가장 거금을 들여 1열에 착석. 물론 1열은 극장에서 가장 좋은 좌석은 아니다. 두 번째로 비싼 좌석으로 책정되었던 걸로 기억한다.
결과부터 말하면 이 날도 대참패. 무대, 의상 등을 모두 현대화했는데 이 것이 오히려 내겐 독이었는지 아주 기이하고 괴상한 극으로 보이더라. 변형 없는 고전의 무대를 먼저 보고 새로운 해석을 접했다면 맘에는 들지 않아도 나름의 관람 묘미가 있었을텐데, 이 날의 관람 경험은 뭐라고 설명하기 참 모호한 것으로, 이 작품 쓸 때 모차르트가 제 정신이 아녔었나 싶기도 하고, 그저 공연이 끝나고나자 착잡하고 한없이 슬퍼졌던 기억이 아련하다. 나랑 오페라는 정말 맞지 않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푸치니의 [라 보엠]은 무대에서 보고 싶다. 그나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 비제의 [카르멘]도 다시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어렸을 적엔 그렇게나 지루하던 판소리가 어느 새 무척 좋아진 것처럼 아직은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 오페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려나? 성급하게 결론 짓기 전에 시도는 조금 더 해 볼 생각이다. 그래도 별로라면 억지로 좋아할 필요는 없겠지. 뜬금없는 비유지만 좋아해보려도 좋아지지 않는 영국 에일처럼 말야.
'플레이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 번의 Miss Saigon, 웨스트엔드 25주년 기념 공연 (7) | 2014.07.28 |
|---|---|
| 2014.2월 웨스트엔드 & 오프웨스트엔드 공연관람기(3) (0) | 2014.07.26 |
| 2013.9월 웨스트엔드 공연관람기(2) (0) | 2014.07.18 |
| The Book of Mormon, 2013/11/01 (0) | 2014.07.14 |
| 웨스트엔드 공연관람기, 2013/09/24 (0) | 2014.07.14 |